1.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 당 자살율은 얼마인가? (2023년 정부 통계 자료 기준)
그리스 : 3.9
코스타리카 : 7.1
오스트리아 : 11.0
뉴질랜드 : 12.1
미국 : 14.7
일본 : 15.6
울나라 : 27.3 (남자 38.3, 여자 16.5) 독보적 일등
2. 그래서 몇 명이나 자살하는데?
2023년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 : 13,978명
매일 하루에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3. 10대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무엇일까?
1위 : 자살 46%
2위 : 암 13%
3위 : 교통사고 8%
참고 : 미국은?
1위 : 사고 36%
2위 : 살인 21%
3위 : 자살 18%
남에게 죽는 미국 청소년, 스스로 죽는 한국 청소년
심지어 10대, 20대, 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
4. 일하다가 죽는 사람이 많을까? 자살하는 청소년 (9살~24살) 이 많을까?
2023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 : 812명
2023년 청소년 자살자 수 : 874명
하루에 두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하다가 죽는다. 그보다 더 많은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일하다가 죽으면 그렇게 난린데,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는 조용하다. 슈카는 이것을 인도에 비유했다. 인도는 스모그가 아주 심한데 건강을 위해 야외에서 운동한다. 인도에서 스모그는 디폴트값이다. 사람들이 그러려니 한다. 외국에서 보면 아주 이상하다. 대한민국에서도 자살을 그러려니 한다. 외국에서 보면 까무러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울나라는 비정상이다.
5. 선진국과 울나라의 출산율과 자살율을 비교하면?
OECD 평균 출산율 1.58 / 울나라 0.72
OECD 평균 자살율 10.7 / 울나라 27.3
출산율은 절반이 안되고 자살율은 2배가 넘는다. 독보적 지존이다.
자료 출처 : 슈카월드 25년 2월 방송 <그런데 왜 아무도 관심이 없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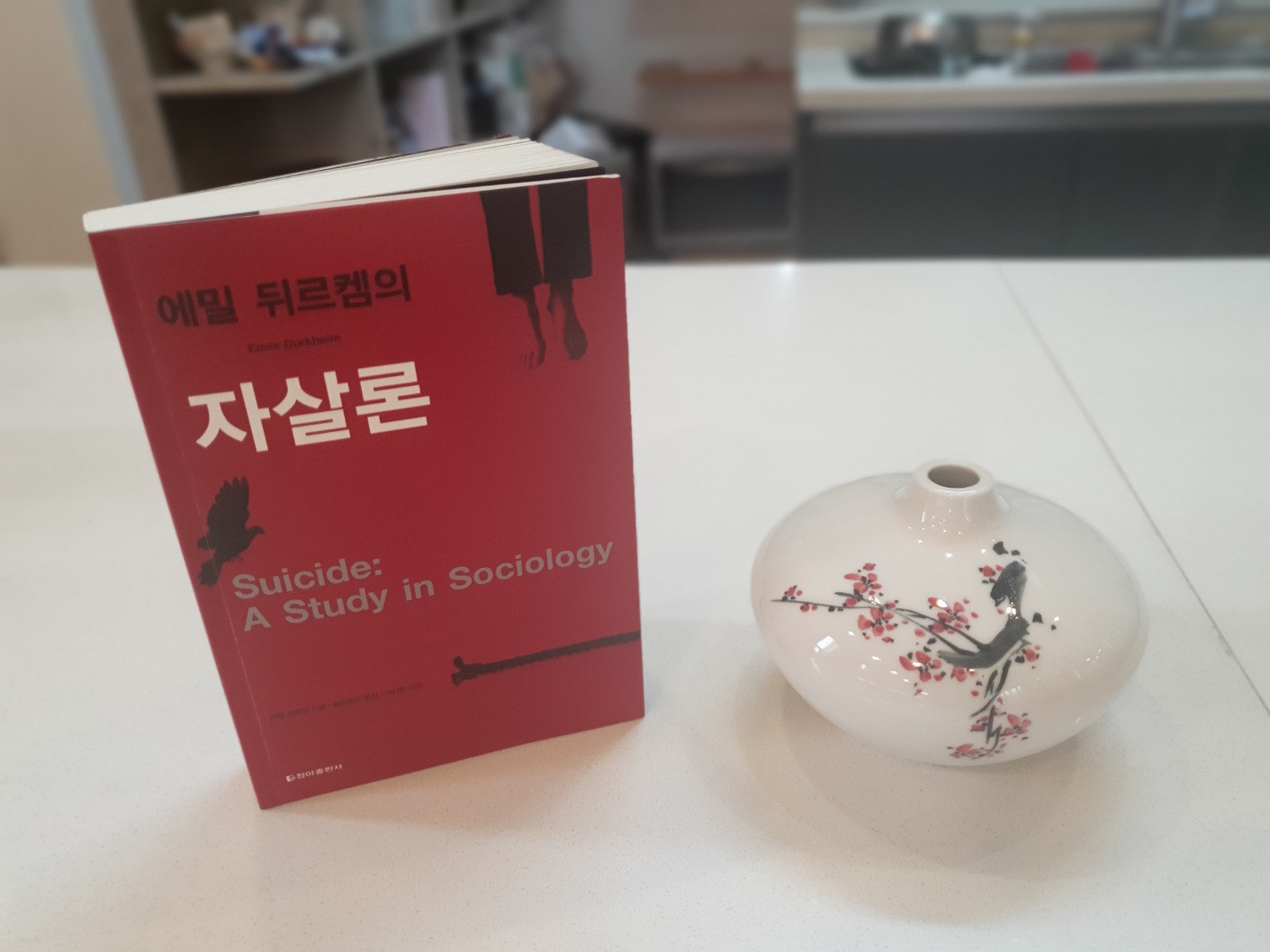
개인은 작은 충격에도 무너진다. 왜냐하면 사회가 그를 그러한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작년 연말에 경근샘의 부고장을 받았습니다. 몇 번을 확인해도 본인 부고였습니다. 사고가 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단란한 가정과 안정된 직장이 있고, 열정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더 열정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러다 동네 책방 생의 한가운데에서 <자살론>으로 강의를 연다길래 얼른 신청을 했습니다. 벽돌 깨기라는 프로그램으로 두껍고 어려운 책을 인제대학교 고영남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읽습니다. 2시간씩 4번을 함께 읽으면 마무리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끌어주는 전문가가 계시니 책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간 동안 어느 나라의 자살율이 일정하게 나타난다면 이것은 곧 사회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는 1866년부터 1878년까지 자살율이 3.0~3.8 정도의 수치를 보입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6.6~7.8, 프랑스에서는 13.5~16.0, 덴마크에서는 25.8~27.7입니다. 왜 이탈리아는 이렇게 낮고 덴마크는 높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 규명하는 것이 사회과학입니다.
뒤르켐은 여러가지 통계와 자료를 조사합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정신질환이나 개인의 체질, 유전적 요소가 자살과 별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추위나 더위, 밤낮의 길이, 살기에 혹독한 기후나 적합한 따뜻한 기후 등 환경적 요소도 역시 자살 현상을 설명하기엔 부적합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자살율은 개인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의 문제라고 결론 짓습니다. 개인이 모여 만든 것이 사회이지만, 사회는 개인의 합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집단 경향'이라고 합니다. 자살율은 이 '집단 경향'이 결정한다고 뒤르켐은 말합니다. 어렵게 썼지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뒤르켐은 자살율을 낮추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 첫째 형벌입니다. 법적이나 도적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육인데, 병든 사회는 교육도 병들었으므로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세째는 사회, 종교, 가족이 이타적 경향을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직업 집단의 도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책을 쓴 것이 1897년이니 당시의 직업 집단은 조합을 말합니다. 교수님은 현재의 시민 사회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책에 자살율에 관한 여러 통계들이 나오는데, 재미있는 것이 있어 소개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혼 후 남자는 자살율이 올라가고 여자는 자살율이 오히려 내려갑니다. 이를 두고 여자는 결혼이 유리할 때 얻는 이득보다 불리할 때 받는 피해가 더 크다고 말하며, 결혼은 남자에게 더 이득인 제도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네, 그렇죠. 아내 잘 못 만난 남자보다 남편 잘 못 만난 아내가 불행할 확률이 훨씬 큽니다. 우리나라만 그런줄 알았더니, 백 년 전의 유럽도 그랬네요.

책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 주변에 내가 기댈 무언가가 있는 사회는 자살율이 낮습니다. 이타적인 사회에서는 자살을 덜한다는 말입니다. 각자도생이 필수이고, 그래서 실패가 사회의 탓보다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우리나라가 자살율이 높은 이유는 당연해보입니다. 더우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사회의 도덕 기준이 매우 높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별일 아닌 일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쪽팔리는 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자살율을 낮추는 방법은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이타적인 사회를 만들면 됩니다. 나라도 살아보자는 이기적인 사회가 아니라 힘들더라도 함께 살아보자는 사회 말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진보가 집권했을 때는 이타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회적 평등, 풀뿌리 민주주의, 부의 재분배, 인권 중시, 시민 사회의 연대 등의 아젠다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론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살율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정치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살율은 반으로 줄여도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큰 담론을 이야기했지만, 요약하면 내 곁에 누군가 혹은 무엇이 있으면 자살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마을에서는 자살율이 0입니다. 국가가, 사회가, 그리고 개인이, 뒤처지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추스려주는 노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쓰고 보니, 말이 쉽지, 되겠냐?는 의문이 남긴 합니다. 사회 현상을 공부하고 알게 되면, 더 막막한 현실 앞에 무기력해집니다. 하지만 내가 살다 죽으면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할 세상이기에 그냥 이대로 주저 앉을 순 없습니다. 미약한 개인이지만 좀 더 힘을 내볼랍니다.
'사회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1세기 미국에서 살아남기 : 제시카 브루더 <노마드랜드> (0) | 2025.04.23 |
|---|---|
| 드라미틱한 삶을 살아가는 탈북민 이야기 : 주성하 <북에서 온 이웃> (0) | 2025.03.01 |
| 장애는 가치가 있는가? : 수나우라 테일러 <짐을 끄는 짐승들> (0) | 2025.01.25 |
| 사이보그지만 괜찮지 않아 : 김초엽 김원영 <사이보그가 되다> (0) | 2021.08.24 |
| 경계의 시간, 이름 짓기를 희망하다 : 허태준 <교복 위에 작업복을 입었다> (0) | 2021.08.18 |



